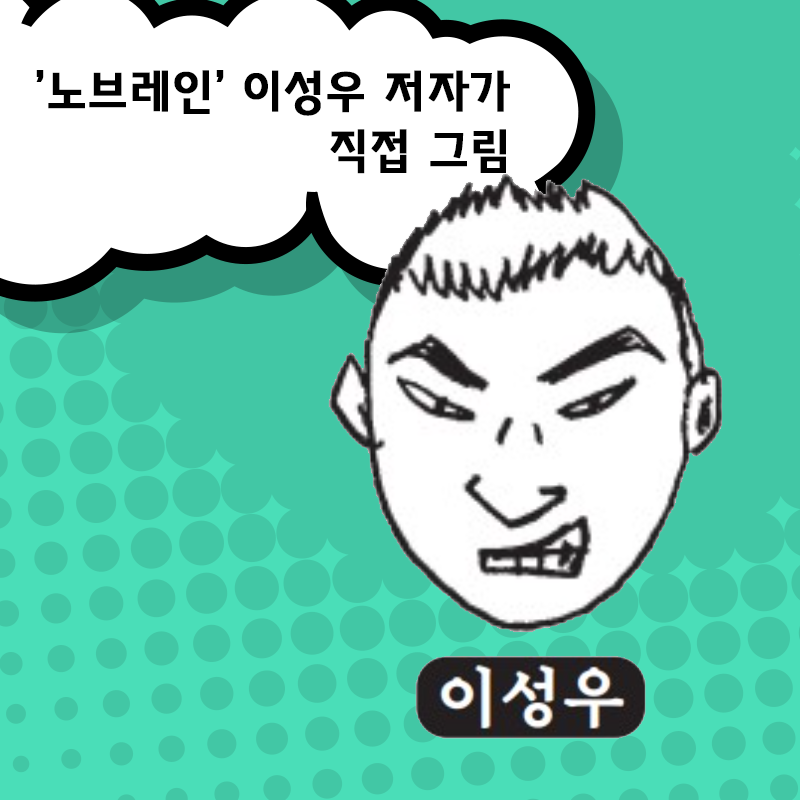세 번째 편지, 록커 이성우 - 사람 만나는 게 싫은 내가 싫어요!
록커 이성우 - 사람 만나는 게 싫은 내가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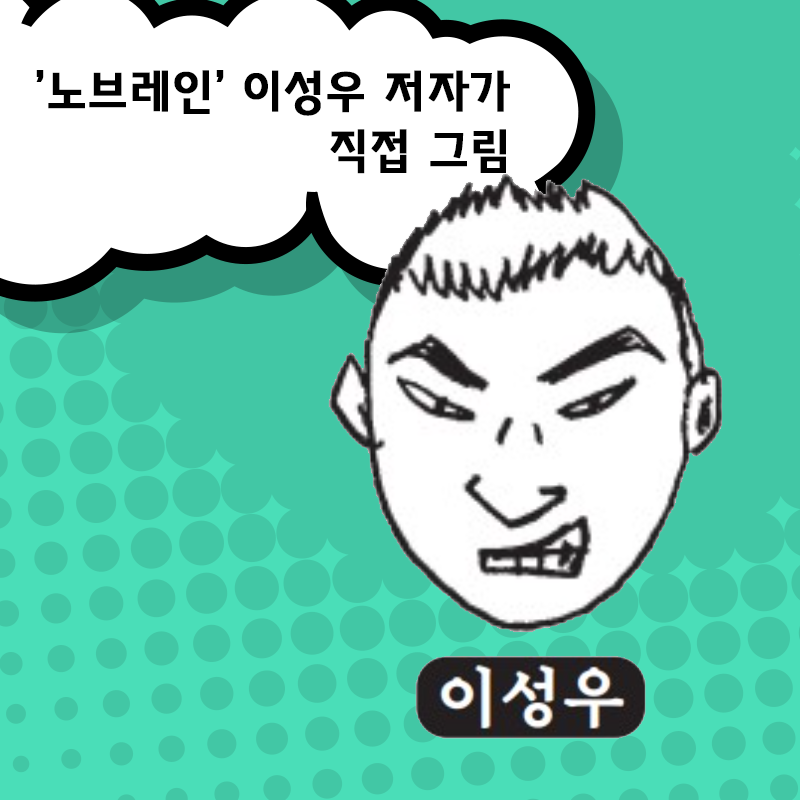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한덕현 선생님께
불면증에 대한 선생님의 해법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다시 패턴을 바꾸고 싶을 때 하루를 꼴딱 지새워 몸을 엄청 피곤하게 만듭니다. 눕기만 하면 바로 잠에 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새벽에 잠을 깨더라도 계속 잠을 청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깨버리면 다음 날 오후에 엄청 피곤해서 패턴을 되찾는 일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푹 자고 9시나 10시 정도에 깨어나면 일찍 일어난 새들만 먹을 수 있다는 맥모닝 세트 하나 먹어 줍니다. 그럼 이제 반은 성공한 거예요. 몸이 아직 아침에 일어난 것에 적응은 못한 상태인지라 정신은 몽롱하지만 뭔가 뿌듯해요.
그래도 요즘은 생활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들려 노력하다 보니 전보다 일찍 일어나는 쾌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 자기 위해서는 역시 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운동을 빡세게 하고 멍멍이들과 부지런히 산책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더 욕심을 내서 햇빛도 더 오래 보고 싶고 하루가 길어지는 마법을 경험하고 싶네요.
제 불면증만큼이나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개성, 다른 취향,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 대하는 방식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수의 인원만 모이는 자리가 편해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도 막상 그 자리를 즐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허탈한 감정에 멍하니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꼭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을 때면 너무 피곤합니다. 만남을 즐기지 못한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요. 물론 가끔 있는 일이니 다행이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즐겁게 놀련다” 이런 마음으로 내던져버리면 또 편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 뭐죠!? 이런 록커도 있는 거겠죠?
아주 가끔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이 말은 물론 헤어질 때 뻘쭘해서 하는 인사치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서로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밥을 먹어도 좋고 그게 힘들면 그래도 뭐 크게 상관없고’라는 식의,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이란 걸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도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라는 말을 하네요. 밥 먹는 거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인데 그 본능에 충실한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순간을 함께 보내는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서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독립하니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이젠 온전히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혼밥을 꽤나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꼭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는 혼자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교수님, “밥 같이 먹자”라는 말에 숨은 사람들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사실 정말 밥을 같이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닐 때도 많은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성우 드림
 록커 이성우 - 사람 만나는 게 싫은 내가 싫어요!
록커 이성우 - 사람 만나는 게 싫은 내가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