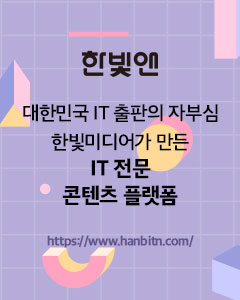IT/모바일
1980년대 후반에는 유닉스 시스템 공급업체가 무수히 많았고, 모두 상표권이 붙은 이름인 ‘유닉스’를 사용하면서 벨 연구소에서 만든 유닉스 제 7판을 바탕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 그러나 서로 호환성이 없었고, AT&T의 시스템 V와 버클리 배포판 사이에는 호환성 문제가 특히 심했다. 양측 모두 공통 표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1984년에 산업계 컨소시엄인 X/Open이 생겼다. X/Open은 어떤 유닉스 시스템에서도 프로그램이 수정되지 않고 컴파일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소스 코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AT&T와 몇몇 동맹 업체는 그들만의 단체인 유닉스 인터내셔널(Unix International)을 만들어 자체 표준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했고, 다른 표준을 내세운 개방 소프트웨어 재단(Open Software Foundation)이라는 그룹과 경쟁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경쟁적이고 서로 다른 ‘개방’ 표준이 두 개 만들어졌다. 결국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면서 기본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한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라는 표준과 X/Open이 관리하는 ‘단일 유닉스 규격(Single Unix Specification)’이 양립했고, 그 사이에 표준화된 라이브러리, 시스템 호출, 다수의 공통 명령어(셸, Awk, ed, vi 등)가 존재했다.
1992년에 USL과 AT&T는 유닉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두고 버클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버클리 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AT&T 코드를 사용한다는 주장이었다. 버클리 측에서는 AT&T 코드를 많이 변경했고 매우 값진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는데, 그중에는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한 TCP/IP 코드도 포함됐다.
버클리 측은 AT&T에서 유래한 코드를 계속 제거하고 새로 작성했으며, 1991년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AT&T의 독점 코드가 전혀 없는 유닉스 버전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AT&T와 USL은 납득하지 못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많은 전략적 움직임이 벌어진 후 뉴저지 법원에서 공판이 열렸고 버클리가 승소했다. 판결 근거 중 일부는 AT&T가 배포한 코드에 저작권 공고를 제대로 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맞소송이 뒤따랐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극히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본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이슈였고 양측 모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 1991년에 AT&T는 USL 지분을 11개 회사에 팔았고, 1993년에는 노벨(Novell)이 USL과 유닉스에 대한 권리를 사들였다. 노벨의 CEO인 레이 노르다(Ray Noorda)는 남은 소송에서 모두 합의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관련 당사자들이 앞으로 유닉스를 판매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였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상의 모든 법적 논쟁은 AT&T가 초기에 우연한 결정으로 유닉스를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무료 사용이 가능했던 대학교에서 사용 비용을 낼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 유닉스가 확산되었고, 이는 유닉스가 적어도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사업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AT&T의 소스 코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도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는 사실상 공공 영역에 있었고, AT&T 라이선스에서 자유로운 버전을 만드는 일이 일상화될 정도로 커뮤니티에 전문가들이 넘쳐났다. 컴파일러, 편집기, 나머지 모든 도구 같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였다. AT&T는 황금 알을 낳는 닭이 닭장을 나간 뒤에야 문단속을 하려는 꼴이었다.
최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