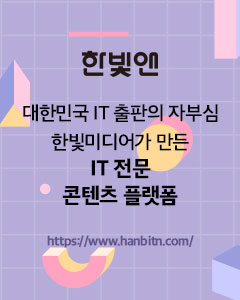컬럼/인터뷰
제공 : 한빛 네트워크
저자 : 김대곤
글을 시작하며
내가 유학을 떠나온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 3년만 더 흐르면 강산을 변한다는 십 년이라는 세월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에 잃어버린 수많은 작은 기억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유학생활에 대해 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지나가지 않는 현재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도 든다.
Life must be understood backward. (Soren Kierkegaard)
(삶은 되돌아 보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다. 첫번째는 내가 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환경들이다. 두번째는 처음에 생각했던 유학가서 하고자 했던 일이다. 이번 기사에는 유학을 생각하게 만든 7년 전에 내가 처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처했다고 생각했던 상황들로 채우고자 한다.
무엇이 유학을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고, 또는 왜곡되어 기억되었지만 (이건 아내와 밤 늦게 길게 옛날 이야기 하다보면 가끔 드러난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어떤 상황들이 내가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는가이다.
개발자 수명은 5년
내가 대학 졸업을 한 건 1998년이다. IMF로 기억되는 그 해는 졸업생들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되는 해였다. 청년실업으로 지금은 한해 한해 아예 현재형 악몽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많은 대학 동기들이 졸업을 늦추었고, 힘들게 받아든 합격증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 운이 좋았는지 내가 합격한 회사는 합격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입문 교육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짤린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말이다. 하여튼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나니 슬슬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개발자 수명은 5년이다". 내가 다닌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였고, 처음 몇 년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에 관리자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대부분의 경력 많은 개발자들은 소위 외주회사는 작은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3년차를 접어들 무렵부터 외주 직원을 "관리"하는 동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리를 나쁘게 또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필요한 일이다. 관리자가 없거나 무능한 관리자를 만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진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입사할 때 하고자 했던 일도 아니었다. 이것이 내가 유학을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다.
합리적이지 않은 일의 진행방식
두 번째는 개발자로서 보는 일의 진행방식이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 번은 고객과 협의를 해서 업무 분석해서 개발하고 있었다. 몇 주 있다고 그게 아니란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개발을 했다. 다시 몇 주 있다가 원래 했던 것이 맞단다. 그래서 또 다시 했다. 그 사이에 개발자들은 당연히 밤 늦게까지 일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책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이다. 책에는 분석, 설계, 개발 그리고 테스트로 이어지는 깔금한 이론이 있었다. 분석이 끝난 시점부터는 개발자가 펼쳐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묘사된 이론이 있었다. 영업팀과 고객 사이에 문제 때문에 아무 하는 일 없이 6 개월 동안이나 허송세월 한 적도 있다. 가끔 사람들은 놀고 돈도 버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하지만, 나에겐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 당시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다. 고객은 "갑"이고 개발회사는 "을"이다. 특히, 정부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이 관계가 명확했다. 하여튼 개발팀은 항상 "을"이였다. 그리고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상식이라는 것이 별로 통용되지 않았다.
야근
아마 이것을 빼 놓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라고 하기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난 정말 야근을 싫어한다. 예전에도 싫어했고,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말이다. 그 당시의 문제는 야근을 했다라기 보다 (분명히 나도 하긴 했다. 아내는 내가 조간신문과 같이 배달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야근을 해야 하는 동시에 당연시 하는 분위기였다. 어떤 상황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시 하면 절대 그 상황이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겐 현실의 문제인 동시 미래의 문제이기도 했다. 시스템 오픈이 다가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또는 선배나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도 말이다. 내가 그나마 야근을 적게 했던 것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난 거의 그 이유로는 야근하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엔 몰랐지만 난 왕따였을 지도 모른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과 통화하다 보면 여전히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사십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십 때에는 야근하면 안되냐고? 더 많이 할 시기 아니냐고 물을 올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 대답은 아니올시다 "였고" 여전히 아니올시다 "이다".
그래서였다
난 직장생활을 접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두 살배기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7년 전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손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나도 무척이나 불안했기 때문이였을 것이다. 내가 떠날 당시에도 유학이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는 아니였고 지금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아마 아무 생각 없을 것이다. 아마 비행기 처음 탄 딸램이 방어하느라 정신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처음 밟은 미국 땅에서 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다시 현재로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내가 처했던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낄까? 여전히 내가 처했던 상황은 많은 개발자들에게 여전히 "현재"일까? 난 그 대답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건 7년 전에 있었던 겪었던 알이고, 지난 7년 동안 나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제들과 부딫혀 싸우느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관심 있는 졸업생이 그 속을 살고 있는 대학생의 문제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글이 그냥 지나간 일들의 심심풀이 이야기가 될 지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될 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전자 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잠시 보이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 하고 싶다.
저자 : 김대곤
글을 시작하며
내가 유학을 떠나온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 3년만 더 흐르면 강산을 변한다는 십 년이라는 세월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에 잃어버린 수많은 작은 기억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유학생활에 대해 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지나가지 않는 현재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도 든다.
Life must be understood backward. (Soren Kierkegaard)
(삶은 되돌아 보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다. 첫번째는 내가 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환경들이다. 두번째는 처음에 생각했던 유학가서 하고자 했던 일이다. 이번 기사에는 유학을 생각하게 만든 7년 전에 내가 처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처했다고 생각했던 상황들로 채우고자 한다.
무엇이 유학을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고, 또는 왜곡되어 기억되었지만 (이건 아내와 밤 늦게 길게 옛날 이야기 하다보면 가끔 드러난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어떤 상황들이 내가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는가이다.
개발자 수명은 5년
내가 대학 졸업을 한 건 1998년이다. IMF로 기억되는 그 해는 졸업생들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되는 해였다. 청년실업으로 지금은 한해 한해 아예 현재형 악몽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많은 대학 동기들이 졸업을 늦추었고, 힘들게 받아든 합격증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 운이 좋았는지 내가 합격한 회사는 합격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입문 교육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짤린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말이다. 하여튼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나니 슬슬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개발자 수명은 5년이다". 내가 다닌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였고, 처음 몇 년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에 관리자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대부분의 경력 많은 개발자들은 소위 외주회사는 작은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3년차를 접어들 무렵부터 외주 직원을 "관리"하는 동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리를 나쁘게 또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필요한 일이다. 관리자가 없거나 무능한 관리자를 만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진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입사할 때 하고자 했던 일도 아니었다. 이것이 내가 유학을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다.
합리적이지 않은 일의 진행방식
두 번째는 개발자로서 보는 일의 진행방식이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 번은 고객과 협의를 해서 업무 분석해서 개발하고 있었다. 몇 주 있다고 그게 아니란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개발을 했다. 다시 몇 주 있다가 원래 했던 것이 맞단다. 그래서 또 다시 했다. 그 사이에 개발자들은 당연히 밤 늦게까지 일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책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이다. 책에는 분석, 설계, 개발 그리고 테스트로 이어지는 깔금한 이론이 있었다. 분석이 끝난 시점부터는 개발자가 펼쳐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묘사된 이론이 있었다. 영업팀과 고객 사이에 문제 때문에 아무 하는 일 없이 6 개월 동안이나 허송세월 한 적도 있다. 가끔 사람들은 놀고 돈도 버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하지만, 나에겐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 당시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다. 고객은 "갑"이고 개발회사는 "을"이다. 특히, 정부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이 관계가 명확했다. 하여튼 개발팀은 항상 "을"이였다. 그리고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상식이라는 것이 별로 통용되지 않았다.
야근
아마 이것을 빼 놓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라고 하기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난 정말 야근을 싫어한다. 예전에도 싫어했고,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말이다. 그 당시의 문제는 야근을 했다라기 보다 (분명히 나도 하긴 했다. 아내는 내가 조간신문과 같이 배달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야근을 해야 하는 동시에 당연시 하는 분위기였다. 어떤 상황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시 하면 절대 그 상황이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겐 현실의 문제인 동시 미래의 문제이기도 했다. 시스템 오픈이 다가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또는 선배나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도 말이다. 내가 그나마 야근을 적게 했던 것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난 거의 그 이유로는 야근하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엔 몰랐지만 난 왕따였을 지도 모른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과 통화하다 보면 여전히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사십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십 때에는 야근하면 안되냐고? 더 많이 할 시기 아니냐고 물을 올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 대답은 아니올시다 "였고" 여전히 아니올시다 "이다".
그래서였다
난 직장생활을 접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두 살배기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7년 전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손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나도 무척이나 불안했기 때문이였을 것이다. 내가 떠날 당시에도 유학이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는 아니였고 지금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아마 아무 생각 없을 것이다. 아마 비행기 처음 탄 딸램이 방어하느라 정신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처음 밟은 미국 땅에서 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다시 현재로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내가 처했던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낄까? 여전히 내가 처했던 상황은 많은 개발자들에게 여전히 "현재"일까? 난 그 대답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건 7년 전에 있었던 겪었던 알이고, 지난 7년 동안 나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제들과 부딫혀 싸우느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관심 있는 졸업생이 그 속을 살고 있는 대학생의 문제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글이 그냥 지나간 일들의 심심풀이 이야기가 될 지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될 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전자 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잠시 보이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 하고 싶다.
TAG :
최신 콘텐츠